그해, 파리를 끝도 없이 돌아다녔다. 골동품 가게마다 발을 멈췄다. 온종일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놀란 낯으로 지레 겁을 집어먹기도 했지만, 감히 그 같은 심경은 입에 담지도 못했다.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과 존재 이유, 행동을 결정지을 유치하고 맹목적인 추구 앞에서 이를 감히 제대로 응시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욕망의 크기에 압도당해, 눈앞에 펼처진 부와 주어진 풍요로움에 질식해갔다
하지만, 그들은 어긋나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미 돌아설 수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끌려다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대개는 조바심을 낼 뿐이었다. 자신들은 준비된 것 같았다. 자신들은 채비가 되어있었다. 그들은 삶을 기다렸다. 그들은 돈을 기다렸다.
제목만 보고 주변의 익숙한, 그러나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물들의 쓸모에 대한 관찰일까? 싶었는데 읽다보니 그 보다는 '내가 소비하는 물건'이 곧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동일시되고, 내가 속한 계층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대 소비사회의 기조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돈과 물건과 인식 사이의 관계와 그 속에서 겪는 상승욕과 혼란에 대한 보고였다.
인스타그램에 넘쳐나는 광고와 물건의 홍수 속에서 소비의 유혹에 누구보다 쉽게 넘어가고, 연속된 야근에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충동구매를 해버리는 나로서는 제롬과 실비의 모습이 잘 안 풀린 버전의 나를 보는듯해 긴장됐다. 맹목적인 소비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는듯해 위기감도 느꼈다.
나 또한 '내가 버는 돈'과, 그보다도 더 직접적으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 더 비싼 집, 옷, 힐링을 명목으로 집에서 혼술을 위해 십만원을 넘게 태운 어젯밤..-의 질이 상승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건 삶을 돈에 종속시키는 삶인걸까?
실비와 제롬이 파리와 튀니지를 왔다갔다하며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듯이 부가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면 언젠가는 부에 대한 열망의 관점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욕망은 언제나 현재형이 된다. 이 넘치는 사물들 사이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뭘까?
물건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광고에 휘둘리기 보다는 소비와 욕망을 좀 더 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하루 질문 하나> 포스팅 시리즈 중 하나인 <불편기록>이었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욕망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기 위한 나만의 훈련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카드값은 어째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이 나간다.
물건을 곧 내 취향을 나타내는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환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내가 굳이 선택하고 구매까지 한 물건들이 나의 선택의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취향의 실체인건 당연하다. 하지만 요새는 내 취향이 물건에 선행하는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야만 비로소 내 취향이 형성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제롬과 실비는 부르주아에 대한 열망에 의해 소비에 짓눌리고 물건과 욕망이 주객전도된 대부분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나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어째 이 책을 다 읽은 다음날 다녀온 전시가 디뮤지엄의 '취향가옥'이었다는 점이 재밌다. '취향'과 '아비투스'의 탈을 쓴 부의 기호에 짓눌려 감탄하게 만드는 전시.
그들의 즐거움은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치라 부르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돈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의 기호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삶을 사랑하기에 앞서 부를 사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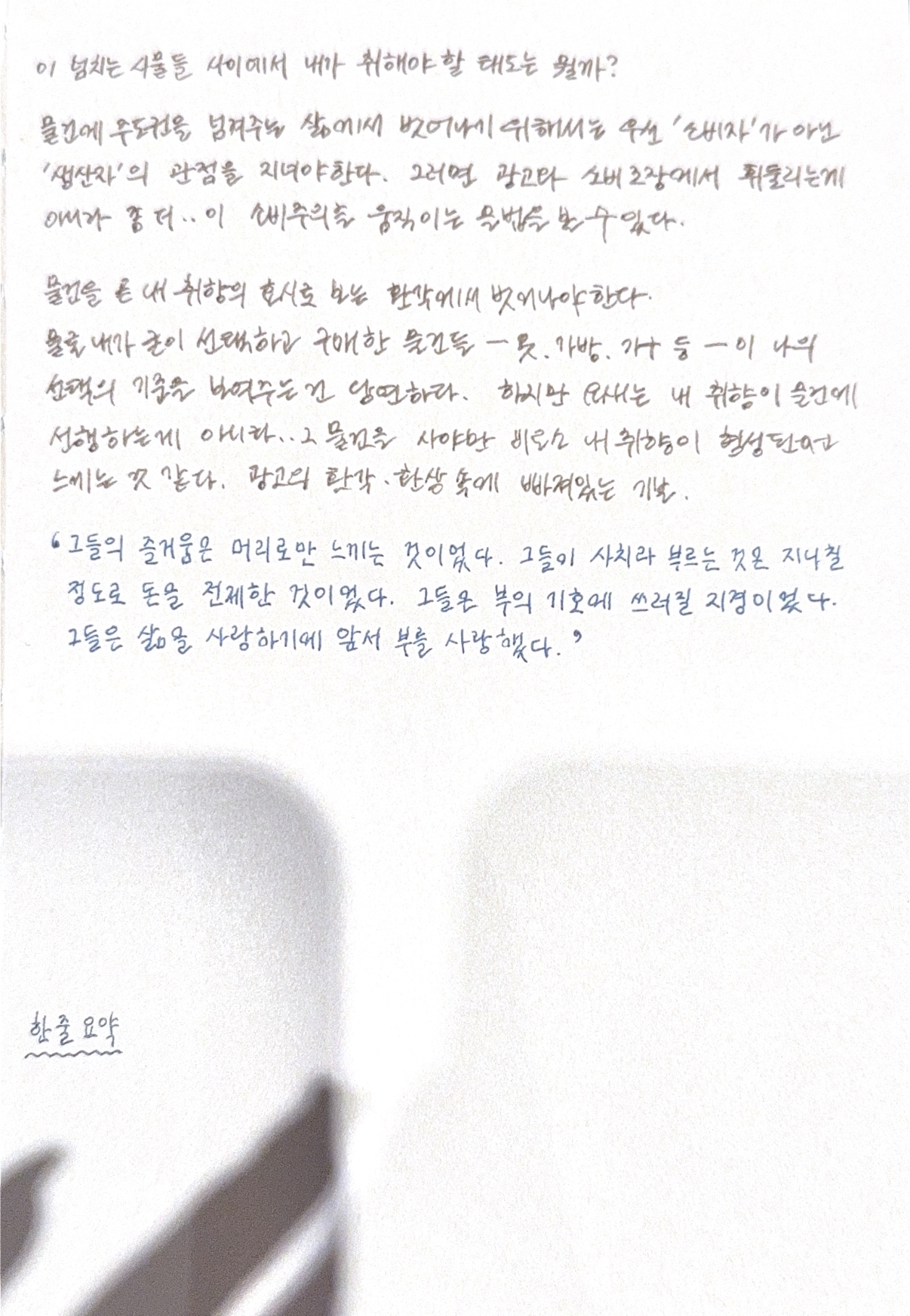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햄릿> 다자이 오사무 (0) | 2025.06.16 |
|---|---|
| <단순한 열정> 아니 에르노 (0) | 2025.06.16 |
| 25.1월~3월 독후감 리스트 (읽은 것과 읽을 것) (0) | 2025.03.16 |
| [2025 출판] 관찰일기 / 바깥일기 (샤를 보들레르+피에르 부르디외 / 조르주 페덱, 아니 에르노) (0) | 2025.02.13 |
| <공간과 장소> 이 푸 투안 (5/14) (0) | 2025.01.05 |